
나은혜 선교사(지구촌 선교문학 선교회 대표)
주방 시설이 없는 선교센터가 점점 불편해 지기 시작했다. 커다란 침대가 두 개가 있는 방은 넓어서 좋았으나 문제는 식사준비를 할 때마다 고역이었다. 화장실에서 야채를 씻고 방에서 요리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끼니때 마다 식사 준비가 점점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 했다.
물론 선교센터의 대식당이 있다. 그곳을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으나 거주하는 방에서 한참을 떨어진 그곳까지 드나들며 요리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집에서 가지고 간 전기 쿠커로 방에서 요리를 하긴 했으나 기껏 찌개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우리 부부만 이라면 모르지만 어머니까지 모시고 간 마당에 매번 찌개로만 식사를 하게 해 드릴 수는 없었다. 노인에겐 음식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식사 수발이 소홀해 지면 어머니의 건강은 바로 나빠질 것이 분명했다. 그런 이유로 아무래도 거처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인의 소개로 황토방을 센터로 가지고 있다는 목사님을 소개 받았다. 그분은 아담한 이층 건물에 게스트 룸으로 쓸 수 있는 황토방 7개를 가지고 있었다. 깨끗하고 괜찮았으나 우리 세 식구가 쓰기에는 방이 너무 작았다. 그런데다 예약이 계속 차 있어서 방이 없다는 것이다. 실망스러웠지만 별 방법이 없는 일이었다.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사모님이 마당까지 우리를 배웅을 나오신다. 그런데 마침 그 때 집 앞을 지나가는 스타렉스 한대가 있었다. 운전자는 사모님과 잘 아는 모양으로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나는 순간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는데 차 안의 그 운전자가 구면인 듯 느껴졌다.
“저 사람 어디선가 본 사람인데 누구지?” 그러는 동안 사모님과 운전자는 인사를 마쳤는지 시동을 걸고 차는 부웅~ 떠났다. 나는 왠지 아쉬웠지만 이미 차는 떠났고 상황은 끝이었으므로 나 역시 그 장소를 떠났다. 그러다가 게스트 룸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소개했던 근처에 있는 비어 있는 펜션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모님과도 작별인사를 하고 우리는 잠시 근처 펜션을 둘러보았다. 10분이나 되었을까 펜션을 둘러 보고나서 자동차를 둔 그 사모님네 마당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사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지나갔던 스타렉스가 다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보였다. 그러자 스타렉스가 멈춰서고 운전자가 창밖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감탄사가 튀어 나왔다. “아~ 선교사님!” 나도 대꾸했다. “저… 분명히 제가 아는 분인데…” 그러자 그가 차에서 내려서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는 곧 몇 마디 주고받다가 오래지 않아서 서로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바로 그 스타렉스 운전자는 오랜 전에 만났던 P국선교사님 이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로부터 함께 후원을 받고 있었다. 그 교회는 4년마다 교회 자체로 여는 선교대회에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초청하였다. 선교지는 달라도 그때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04년 여름에 터키에서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 9박인지 10박인지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여행을 했었던 기억이 났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 저편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다. 그 선교사님이 나를 보면서 말했다. “K선교사님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나 선교사님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나도 말했다. “터키선교대회 때 선교사님이 버스 안에서 들려준 아픈 간증 너무 마음에 와 닿았었지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나누던 과거의 현장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그 선교사님은 당장 자신이 묵고 있는 센터를 같이 가 보자고 하였다. 앞서가는 스타렉스를 쫓아 우리 황금 소돌이(소나타)도 열심히 쫓아갔다.
어둑어둑해진 다 저녁에야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한림읍 금악이란 곳이었다. 농지 가운데에 빨간 단층의 황토집 세 채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똑같은 모양의 황토방이 24개 있는 그곳은 정갈해 보였고 깔끔했다. 더블사이즈 침대 두개가 방마다 놓여있고 개인 냉장고와 텔레비전과 욕실이 있는 방으로 하얀 침대커버가 단정하게 씌워져 있었다. 부엌은 공동주방이 있었는데 비교적 넓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다.
그 선교사님은 나에게 “이 센터의 주인인 목사님에게 말씀드릴 테니 내일 오세요.” 그리고 찬거리가 없다며 그 선교사님은 라면을 끓여 주었다. 밤운전을 하여 제주 선교센터로 돌아오면서 남편과 나는 각자 생각에 잠겼다. 나는 속으로 방은 깔끔하다마는 세 사람이 쓰기엔 너무 좁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튿날 센터 주인인 목사님을 만났다. 그분은 우리 어머니를 보고 관심을 가졌다. 어머니의 연세를 물어 보고는 자신의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보다 한살이 많다고 하면서 친절히 대해 주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내게 말했다. “저희 센터에 오세요. 방은 그냥 빌려 드릴 테니 전기 값만 좀 내세요. 전기세는 제가 받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받아 가니까요.”
유머러스한 센터 주인 목사님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그는 곧 이어 그 선교사님에게 “방은 두 개 내 드리세요.” 하였다. 나는 예상치 못했던 친절에 감격 하였다. 사실 한방에서 세 식구가 다 사용하라고 했으면 황토방이고 좋긴 했겠지만 좀 좁았을 것이다. 제주 선교센터는 한 칸이긴 했지만 웬만한 방 두칸 턱으로 넓었었기 때문이다.
선교센터는 꼭 선교지에 세워진 센터 같은 기분이 들게 하였다. 센터 주변이 다 농토인데다 빨간 황토벽돌로 나지막하게 지어진 모습이 그런 느낌을 주었다. 앞마당엔 키가 큰 소철나무를 옮겨 심어 놓아서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풍겨 내고 있었다. 그 소철 한참 너머로는 커다란 선풍기 모양의 풍력발전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 운치를 더해 주고 있었다.
이처럼 평화롭고 한가로워 보이는 이 센터에서 우리 가족은 여행의 남은 시간을 잘 채우고 돌아올 수 있었다. 물론 주방이 같은 층인 일층에 있어서 식사 준비도 어렵지 않았다. 게다가 쌀과 김치 기본 양념 등을 제공해 주어서 더욱 감사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이렇게 풍성히 채워 주셨다.
하나님은 십여 년전에 만났던 선교사님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극적으로 만나게 하셔서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다. 그 때 그 시각에… 참 절묘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아는 사람도 연고도 없는 제주에 와서 한 달을 살아 보겠다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뜻밖의 만남’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수는 참 많기도 하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글/사진: 나은혜
세션 내 연관 기사 보기
편집국
Latest posts by 편집국 (see all)
- “한국의 대전략: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영국 킹스칼리지 대학 파르도 교수 책 펴내 - 04/17/2024
- [나은혜 칼럼] 개척은 설레임이다 - 03/13/2024
- [김현태 칼럼] 선교사와 자동차 🚗 - 03/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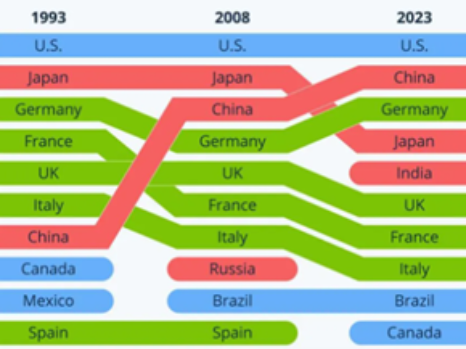






![[경제] “대한민국 청년이 불행하다”… 집값 내려야](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07/5094_7344_213-150x150.jpg)
![[시사] MBC 사장 긴장하나? 배현진 아나운서 자유한국당 입당 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높아.](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03/이미지-1-2-150x150.jpg)

![[정성구 칼럼] 월드컵과 올림픽](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1/04/정성구-박사-150x150.jpg)
![[한국] 문여적 출범…”문씨 대통령 아니라…김정은 하수인”](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0/국본2-150x150.jpg)
![[나은혜 칼럼] 정의로운 삶을 산 부자(父子)](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1/07/20210719-나은혜-150x150.jpg)

![[오피니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국정 연설](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02/sotu-890x395_c-150x150.jpg)
![[나은혜 칼럼] 모처럼의 제주여행](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2/06/20220618-나은혜-scaled-e1655785828615-150x150.jpg)
![[시사] 황교안 대표, ‘꼼수’에는 ‘묘수’로. 비례한국당 출연 예정, 속 타는 민주당](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9/12/크기변환DDD-150x150.jpg)
![[사회] 그 다음은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2/TeacherChecked-1250x650-890x395_c-150x150.jpg)
![[군사] 미 국방부, 사거리 3천400 마일 핵미사일 실험 강행. 북한 노리나?](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9/12/이미지-1-150x150.jpg)
![[시사칼럼] 부족애(Tribalism) VS 조국애(Patriotism) 무엇이 우선인가?](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7/03/김현태-목사-150x150.jpg)




![[사회] NASA 인사이트호 7달 걸려 화성 착륙](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1/nhq2018112601032-150x150.jpg)
![[시사] 태극기 세력에 찍힌 탄핵 7적. 누군지 알아보니…](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2/pjimage-51-150x150.jpg)

![[시사] 트럼프 떠나자마자 15시간만에 말바꾼 문재인 정부. 한미 외교적 갈등 불씨 되나?](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7/11/이미지-3-150x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