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저녁에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는 문득 사랑스러워졌다. 그래서 어머니께 장난끼 어린 이야기를 걸었다.
“어머니, 참 이상하지요? 어머니가 나를 안 낳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딸처럼 어머니와 같이 살고, 함께 손잡고 다니는거 참 이상하지요? 어머니가 낳은 딸이 둘이나 있는데 말이예요.” 했다.
그런 나를 어머니가 바라 보고 웃으신다.
어머니의 표정은 하나도 안 이상하다는 표정 이시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내 이야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셨는지 궁색하게 한마디 하신다. “개(딸들)들은 바쁘잖아.”
며느리인 나는 안바쁘고 어머니의 딸들만 바쁘다는 말씀인지…. 난 누구보다도 바쁜데…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큰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이인 것이다. 아~ 하면 어~ 하는 그런 사이 말이다.
우리 어머니는 이북 분으로서 함흥이 고향이시다. 20살에 혼자 남한으로 오셔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셨다. 그리고 대한 적십자사에서 주최한 이산가족 만나기에 뽑혀서 50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여 여동생들 세명을 만나고 오시기도 하였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늘 고향 생각을 하신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 생각을 하시는 것이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도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오늘은 유난히 보고 싶다.” 고 하시는 것이다.
어머니를 낳아서 20년 동안 키워주신 친정 어머니를 아직도 못 잊으시는 것이다. 어머니 연세 86세이니 벌써 65년이 흘렀는데도 말이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 가운데 가장 그리워 하는 존재는 자신을 몸속에 품고 있다가 낳아주신 어머니라는 것을…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많은 사형수들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하면 “어머니~” 를 부르고 죽는다고 한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신다. 나는 어머니와 남편의 뒷모습을 뒤에서 따라가며 바라 보았다. 수십년전 우리 어머니는 저 아들을 낳아서 기저귀를 갈아가며 젖을 물려서 키우셨을 것이다.
그런데 수십년이 지난 오늘은 그 아들을 의지하고서야 길을 걸어 가실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다 전혀 어머니와 관계 없는 내가 그 아들로 인해 며느리가 되어 어머니의 노후를 돌보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나도 언제부터 인가 내 마음속에 어머니는 내가 돌보아 드려야 할 분인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남편의 모친 이시기도 하지만, 어느새 그분은 내 어머니가 되신 것이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말이다.
내가 친정 어머니를 대하듯 그런 편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녀관계인줄 알고 있다. 병원에서도 미장원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우리를 고부간이 아닌 모녀지간 이냐고 묻는다. 우리가 닮았다는 것이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제자훈련을 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분명히 다른 얼굴인데도 내가 제자 삼은 자매의 얼굴이 나와 비슷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았다. 이처럼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 닮아 가나 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룻기1:17)”

나은혜 선교사(지구촌 선교문학 선교회 대표)
세션 내 연관 기사 보기
편집국
Latest posts by 편집국 (see all)
- “한국의 대전략: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영국 킹스칼리지 대학 파르도 교수 책 펴내 - 04/17/2024
- [나은혜 칼럼] 개척은 설레임이다 - 03/13/2024
- [김현태 칼럼] 선교사와 자동차 🚗 - 03/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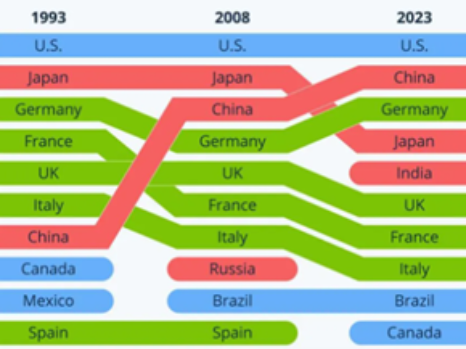






![[시사] 고든 챙,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agent)일 수 있다”](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0/agent-150x150.jpg)
![[종교] “천주교회가 좌익사제들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0/5922_9151_4119-150x150.png)
![[김대령 박사의 5.18 역사전쟁 43] 무장시민들의 총기난사 기념 눈물 공연](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0/11/역사전쟁-사진-63-150x150.jpg)
![[시사] 김진태의 목을 친다? 자유한국당 내분 격화 조짐.](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06/35629235_1724148364329652_5470884691164790784_n-150x150.jpg)
![[시사]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트럼프 회담 취소하자, ‘김정은 엎드려 애원'”](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06/150218_rudy_giuliani_ap_1160-150x150.jpg)
![[이동규 칼럼] 붉은 악마가 교회를 삼키다.](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05/이동규-목사-150x150.jpg)
![[시사] 김석기 의원, “LH 공사, 대북 제재 피하는 방법 비공개 용역 발주”](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0/46471_68263_2643-150x150.jpg)
![[시사] 국가 안보 걱정하는 예비역 군 장성들 모여 토론회 연다](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1/이미지-1-6-150x150.jpg)


![[김대령 박사의 5.18 역사전쟁-41] 완도 사람 김재평의 수상한 동선](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0/11/역사전쟁-사진-62-150x150.jpg)
![[한국] 대한문 國本, 24일 박대통령 2심 선고 앞두고 긴급 성명 발표](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08/art_15349276160708_1cda9e-150x150.jpg)

![[김현태 칼럼] 성철스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1/07/김현태-성철스님-150x150.jpg)

![[논설] 조국, 진보 가면 속엔 기생충만 우글](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9/11/9374_16586_3340-1-150x150.jpg)
![[나은혜 칼럼] 축복을 빌어주러 온 세 천사](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2/46985940_2066372543405579_8442141400090279936_n-150x150.jpg)
![[칼럼] 미주에서 열린 박상학 대표 강연회를 다녀와서](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9/05/박상학-150x150.jpg)


![[시] 생일 선물 / 오봉환](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2/05/오봉환-1-150x150.jpg)